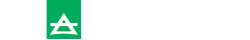교수칼럼
| [문학공간] 시란 무엇인가? - 김용희 교수 | |||
|---|---|---|---|
| 등록일 | 2020.11.18 | 조회수 | 2863 |
|
시란 무엇인가? -희망으로 쓰는 사랑의 편지-
시절인연이 닿았는지 두어권의 시집을 냈다. 시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없겠다. 누구나 마음 한 켠에는 ‘시(詩)공간’이 놓여있다. 시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인은 누구인가?
‘불학시 무이언’ (不學詩 無以言 論語 ?季氏?, 시를 공부하지 않고는 말할 것이 없다, 시삼백 사무사(詩三百 思無邪)(공자). ‘시는 인간의 가장 완벽한 발언이다’(영국의 매슈 아널드). 기위인야 온유돈후시교야(其爲人也 溫柔敦厚詩敎也), 그 사람됨이 언사나 얼굴빛이 온유하고 성정이 돈후함은 시경(詩經)의 가르침의 효과이다. ‘마음이 따뜻하고 인자하며, 부드럽고 조용함’ 곧 온유돈후(溫柔敦厚)함이 시(詩)의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어야 한다(퇴계).
1. 시는 사랑의 언어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를 쓸 수가 없다. 시는 사랑의 노래이다. 자연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삶의 본질과 선물에 대한 사랑...시는 피폐했던 옛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흔들거리는 현실까지 그렇게 지난한 세월을 살아오며 그 속에서 살갗에 와 닿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노래의 언어이다. 한 시대를 안고 온 흔들리는 삶에서의 보편적 언어이다.
2. 시는 개체적 삶의 실존적 허허로움을 전하는 도구이다. 시는 실존이다. 그리고 ‘존재의 언어’다. 도달을 수 없는 이데아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곳에 대한 마르지 않는 그리움, 그것은 실존적 허무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존재적 허무는 삶의 바탕이다, 비록 감사로 은혜로 은총으로 눈물로의 삶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바짓가랑이를 파고드는, 등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허무를 감출 수는 없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기에 그렇다. 그러기에 어쩌면 또 인간일지도 모른다. 봄날 꽃잎이 지는 허무를 누가 어떻게 이겨내랴, 별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으랴, 인간은 그렇게 실존적 허무 속에 산다. 그리고 시간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릴 때 하염없이 불어오는 바람 앞에 설 수 밖에 없다. 하여 시는 ‘바람 앞에 삶’을, 그 잡히지 않는 바람에 대한 원망(遠望)과 절망일 수도 있겠다.
3. 시는 세상에 나부끼는 빈 깃발들의 허상을 깨우는 종소리이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일까? 세상 것 다 가질 수 있다고, 다 밝힐 수 있다고 깃발 높이드는, 그런 허상에 몰려가면서 자아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는 소시민의 낙타같은 삶에, 시는 그 깃발이 허상임을 알게 하는 종소리이다. 시는 욕망은 가을바람에 꽃잎 지 듯 늘 지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린 인간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늘과 지금 뿐인 것을... 시는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임을 깨우는 종소리이다.
4. 시는 희망으로 쓰는 구원의 약속이다. 인간은 도전과 반응, 획득과 상실 속에서 바람으로 산다. 그러다가 잊은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끝내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끝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시인의 시야는 얕은 내를 무릎 걷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피투성이가 되어 건너온 이후에야 쓰는 사랑의 노래이다. 아니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시인의 역할과 몫이다. 과거지향적이고 관조적이고 어둡고 관념적인 이야기들은 하나의 의미로 되살려내서 실존적 허무로 치닫던 시어들을 새로운 힘과 생명을 얻게 교체한다. 그래서 시는 절망 속에서 끝내 다시 쓰는 희망이다.
5. 시는 허무적 세상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이다. 시에는 세상과 마주선 한사람의 역사와 삶의 궤적이 묻어 있고 가족적 사랑과 바람 같은 삶에 대한 허무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중년) 시절쯤의 보편적 고독을 깊게 느끼며 나아가 진리 앞에서 얕게 떠도는 이 시대의 논리와 언어들에 지쳐 가며 그럼에도 더욱 영원한 사랑에 갈증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다. 결국 감성을 너머 영성으로의 그리움을 은유와 비유와 제유(提喩Synecdoche)와 환유(換喩, Metonymy)를 통해서 그려내기도 하는 것이 시다. 비오는 깊은 밤 홀로 깨어, 그리고 봄 벚꽃이 바람에 질 때, 가을날 낙엽이 포도 위를 구를 때 우린 그리움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차창밖에 풍경처럼 스쳐는 세월에 그리움과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어린 아기가 하얗게 웃을 때, 담쟁이 넝쿨이 묵묵히 벽을 오를 때, 별이 바람에 스치울 때 우리는 환희의 눈물 혹은 고독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6. 시는 곧 주. 객관이, 대상과 주체가 혼융된 하나의 존재적 언어다. 시어(詩語)는 피안의 언덕너머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위안과 안식을 줄 뿐, 그렇게 아스라이 어슴푸레 그 깊은 존재와 사랑을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내리는 달빛처럼 간간히 느끼게 할 뿐, 시는 감상과 감정 너머 영혼의 노래, 이성과 감성의 끝에 매달려 있는 열매가 아니라 온통 그것들의 바탕이고 터전이며 그것들 자체이다. 시인은 시어를 통해 우리의 본질과 태고적 향수과 창조의 근원으로 가고자하는 실험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어는 언어 이전의 언어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로 가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다. 일상의 언어 그것은 존재자(das Seiende)적이고 제한적이고 구조적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찾고자하는 것은 설명되어 질 수 없기에 비유와 예시가 등장하고 시가 등장한다. 존재자적 언어는 이성적 판단, 분석, 과학적 검증, 이렇게 우리의 의식 내에서만 그 길을 모색한다. 현대는 해체주의의 시대다. 해체주의란 아무것도 규정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게다. 어떤 것도 정의 할 수도, 규정할 수도, 서술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저 보여줄 뿐이며 그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고 있는 그 무엇(흐름)일 뿐이다. 니체로부터 시작된 허무주의는 이런 해체주의시대를 열고 있다.
7 . 시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길의 가로등이다. 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이다,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그 무엇에 대한 묘사가 시이다. 진리는 존재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설명들은 존재자 적이다. 그것이 현대사회 신앙이 맞는 비극의 시작이요 한계의 처음이다. 그리하여 시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문을 두드리는 도구이다. 망치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한풀이도 자기긍정도 더더욱 자기과시도 아니어야 하겠다. 그건 결국 영혼의 맑음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로서의 의미가 시작되는 것이다. 시를 짓는 마음 그것은 밤새워 수도 하는 수도승과 다를 바 없겠다. 영혼을 갈무리하여 조금씩 맑혀낼 수 있다면, 거추장스럽고 허망스런 거짓 자존의 집을 부셔낼 수만 있다면, 영혼의 크기와 깊이가 어떠하든 흩어진 샘을 고요히 하여 구정물 맑히듯 하는 도구가 된다면 ... 스치며 지나는 시간들을 하나의 의미로 되돌러놓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전제 되어야 할 것이 삶을 마주하는 진솔함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를 팔고 문학을 파는 장사꾼, 심미적 감성과 값싼 현학의 놀음 꾼에 불과하지 않을까. 산다는 건 '속이지 않음' '도피하지 않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수필은 '낙엽타는 냄새에서 가을을 느낀다' /라고 하지만/시는 '어느 가을날 낙엽을 모아 태운다'라고 쓴다/ 수필은 '겨울바람이 차다'라고 하지만/시는 '찬 겨울바람 앞에 선다'라고 한다/ 수필은 '그리움에 잠 못드는 밤'이라 하고/시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귄가하노라" 한다/‘찬 가을날 낙엽을 모아 태우던 날 /잎이 지고 있었다 <시와 수필> -순수로 피는꽃 중-
어떻게 살았던 우리는 모두 삶 그 자체를 선물로 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연약함과 병약함. 가난과 실패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왜 ‘그 속에 감추어진 위대한 진실’이 있는지를 우리는 시를 통해 찾고 시를 통해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다.
문학공간, ‘사색예찬’ 웹·문예창작학과 김용희 교수
|
|||
| 이전글 | 양수리의 아침 - 김용희 교수 | ||
| 다음글 | [한국농어촌방송] 테스형의 가을, 고향기행 - 김용희 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