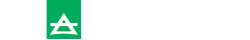교수칼럼
| 양수리의 아침 - 김용희 교수 | |||
|---|---|---|---|
| 등록일 | 2020.11.30 | 조회수 | 2648 |
|
양수리의 아침
가을이 가기 전 다시 가을이 보고 싶다. 가을의 끝자락에 갑자기 내려간 수은주, 11월 초 두물머리 새벽 찬 공기는 영하 3도를 가리킨다. 이미 떨어져 빈 가지가 되었거나 아니면 가지 끝에 매달린 빛바랜 가을단풍, 또 한해가 마감하는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또다시 시공간의 매정한 절대성 앞에 선다.
가을의 끝자락이라도 붙들고 그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새벽길을 나선다. 하지에는 5시 반 동지는 7시 반에 날이 새니 지금은 6시 반쯤이 어둠이 걷히는 시간, 동트지 않는 새벽 길, 이리도 많은 분들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줄 미처 몰랐다. 외곽순환도로를 돌아 양수리로 향하는 새벽 길, 차량불빛들만 분주한데 동쪽하늘에서 서서히 붉고 푸른빛이 돋기 시작한다.
이렇게 새벽이 깨어나는 시간이 좋다. 하루에 조석으로 잠깐, 아침이 열리는 시간 어둠이 내리는 시간, 그 시간들이 참 좋다. 이 시간을 동양에서는 현(玄)이라 한단다.
요즘은 사진을 찍을 땐 빛을 찍고 싶다. 해서 이 시간 때가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일몰과 일출의 시간. 양수리 팔당 호반에 비친 가을새벽. 청보라 빛 동녘 하늘을 보며 도착한 두물머리. 3천원 주차장엔 아직 검표원이 없다. 느티나무 밑에는 몇몇 사람들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걷히지 않는 어둠 속에서 '거져 와 줄 오늘'의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찬공기 잔물결 새소리... 늘 그렇게 열리는 양수리의 아침 아니 새벽. 우리 도시민들은 이런 경험에 초대받지 못했다.
카메라와 휴대폰 두개를 동시에 거치대 위에 설치하고 추워서 동동대는 세월 낚는 중노년의 사진작가, 4년 경력이란다. 그 옆 분은 40년. 근데 그 기간이 중요한건 아니란다. 선천적 감각이 중요하단다. 동해일출부터 전국을 누비며 찍은 사진들을 궁금하지도 않은 오다가다 본 이에게 자랑하듯 보여준다. 노년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고 자연 속으로 다니니 건강취미로는 최고라고 자신들의 삶을 전시한다. 가장 아름다운 곳을 가장 좋은 시간에 찾아가는 것이 출사들의 일이라고, 그건 맞지 싶다.
팔당호 건너편 낮은 산이 점점 더 붉게 변한다. 기러기 떼 무리지어 높게 날고 백조(스완 고니) 몇마리 울음소리 가을 새벽을 재촉한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해가 돋고 지는 속도는 빠르다. 뜨고 지는 모습이 활동사진으로 보인다. 일몰과 일출의 느낌은 다르다. 일출이 생동감과 희망 기대가 숨겨진 설레임이라면 일몰은 아늑함과 아쉬움 그리고 속절없는 그리움같은 것이 배여 있다. 찬란하게 서서히 솟아오르는 해, 산등성 위로 금 새 솟는다. 호수에 비치는 강력한 새벽 햇빛, 그렇게 양수리의 새벽은 열리고 있었다. 빛과 어둠 어둠과 빛 그 빛들이 혼융되는 시간, 수문장 교대하듯 밤과 낮이 교환하는 시간, 이 성스럽고(?) 찬란한 그리고 조용한 비밀의 시간을 우린 의도하지 않으면 볼 기회가 없다. 농부들이 축복인 것은 이런 장면을 매일 보듯한다. 이전 농경사회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도시민들은 콘크리트 속에 갇혀 산다. 자연을 잊었다 잃었다.
노을빛에 물든 코스모스 밭의 각양각색의 꽃들에 비치는 석양빛, 조석의 시간이 아니면 그 꽃들이 만들어내는 빛깔들을 보지 못한다. 한 낮에는 보이지 않고 석양의 조명 비스듬히 비치는 햇살에서만 그 찬란하고 묘한 색상들이 나타난다. 단풍도 단풍에 비친 햇살을 찍어야 현란한 이름다움이 보인다, 즉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고싶은 게다. 어느 목사 분이 빛의 작가라고 짚어준다. 작가수준은 절대 아니고 일시적 호기심.
시골 가서도 새벽과 일몰에 꼭 강변 둑을 거니는 이유가 그것이다. 저녁놀에 하얗게 부서지는 억새풀들이 흩어내는 석양빛도 장관이요 강물에 비치는 새벽 푸른빛도 설레는 풍광이다.
곧 가을은 겨울로 갈게다. 지금은 나무들이 낙엽을 지우고 나목이 되어 긴 동토의 겨울을 준비한다. 이름다운 것들은 그렇게 짧다. 수락산의 저녁놀 양수리의 새벽안개.
산다는 게 뮐까? 평생해도 얻지못하는 답변, 순간의 선택과 아름다움 그리고 끝내 놓을 수 없는 희망 애정 설움 아쉬움 그리고 미련, 또다시 꾸는 꿈과 용기... 산다는 건 부대낌과 어려움 수고 질시 반목 경쟁... 하루도 이런 어려움들에 혹은 가끔의 축복에서 우린 무관하지 못한다. 그 희노애락애오욕이 우리의 삶이겠다. 사단칠정? 사단이 양심이고 칠정이 오욕이라고? 뭐 그리 나눌 것은 뭔가. 나누지 말라는 게 노자(老子) 아니던가.
우린 세상에 경험하기 위해 왔단다. 가난도 부도 어쩌면 선택이란 것. 해서 항상 부가 선이요 참이란 것도 아니란다. 그렇게 성장해서 드디어 자유함이 될 때까지. 보시(普施)하는 이들은 이미 그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말자 이게 모두 경험의 과정이란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그렇게 경험하는 것, 선악이라면 악도 선을 위한 도구겠지. 닿을 수 없는 피안의 언덕 그건 우리를 이끄는 지표요 그리움일 뿐, 욕심내지 말고 회피도 말고 안따깝고 아쉬워하며 그리 사는게지.
양수리의 물빛과 호수의 잔물결은 늘 무심하니깐, 한 잔의 커피로 아침을 맞자.
웹·문예창작학과 김용희 교수
|
|||
| 이전글 | [한국농어촌방송] 인간은 기계인가?, 초인공지능의 출현 - 김용희 교수 | ||
| 다음글 | [문학공간] 시란 무엇인가? - 김용희 교수 | ||